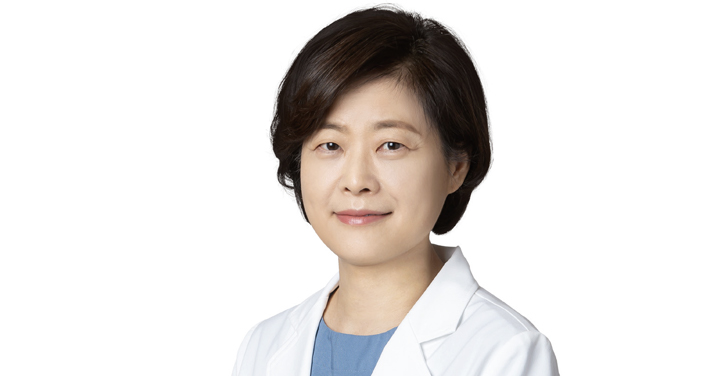SECTION Ⅰ
essay

인간이 ‘본다’는 것은
일차원적이며
최고의 사고행위
일차원적이며
최고의 사고행위
K-팝처럼 세계 주요 언론에 자주 오르는 단어가
K-방역(quarantine)이다. 검사 - 추적 – 격리 및
치료로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응방법은 오로지
한국만이 지닌 독특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현저하게 적다.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더욱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나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염병은
국민 스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르다.
글 구승준 번역가 · 칼럼니스트 / 사진 백기광
서양인들은 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할까?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쓰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곳곳에서 마스크 쓰기를 끝내 거부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제지당하곤 했다. LA에서는 마스크를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서양인들은 왜 이렇게 마스크에 민감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서양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는 허구’라는 음모론에 휩싸였으며, 심각한 경기불안과 일자리 감소로 쌓여 있던 불만이 ‘마스크 안 쓰기’ 운동으로 터져 나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스크 안 쓰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양인들의 시각적 관습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레이철 잭 박사 연구진은 서양인과 동아시아인을 각각 15명씩 뽑은 후,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고 이를 설명하게 했다. 이 실험에서 동양인은 눈을 보고 감정을 판단하지만, 서양인은 입 모양을 먼저 보았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웃는 이모티콘을 ‘^^’라고 쓴다. 입 모양이 없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눈 대신 웃는 입 모양을 표시하여 ‘:)’라고 쓴다. 서양인은 입을 통해 주로 소통하고, 동양인은 주로 눈을 통해 소통한다. 표정을 인식하는 데 동서양의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고대에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동양의 우주관은 전체, 서양의 우주관은 개별
동양인은 예로부터 우주 만물이 텅 빈 공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양인에게 우주공간은 비어 있지 않으며, 설령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생명의 태동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그러나 예로부터 서양인은 우주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비어 있다고 생각해왔다. 텅 빈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은 각각 독립적 개체일 뿐이다. 하지만 동양인은 별과 별 사이의 공간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텅 빈 공간으로부터 별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양 언어권에서는 정관사나 부정관사, 단수, 복수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책상(a desk), 하나의 의자(a chair) 등 모든 것을 독립된 개체로 본다. 버클리대학교 심리학과 펑 카이핑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무슨 과일요? 바나나 한 개? 사과 한 개? 딸기 한 개?’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동양에서는 서양만큼 단수와 복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전체 중의 하나이며, 하나 안에 우주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은 한의학에서 ‘인체가 소우주’라는 관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과 다름없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본다’는 것은 결코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눈의 망막을 통해 이미지를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 ‘본다’라고 할 때는 ‘알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 영어에서 ‘보다’를 뜻하는 단어인 ‘see’는 ‘안다’는 말과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언어에서도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대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언제 한번 보자!’, ‘보고 싶다’라는 말도 있다. 이는 눈의 망막으로 한번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느끼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는 시각적 행위를 통해 만나고, 알고, 마음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한다. 인간이 ‘본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행위인 동시에 사고의 최정점을 이루는 사유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대한 물폭탄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은 경이감으로 가득 찬다. 때로는 그 경이감이 너무 커서 이성적 사고를 못 할 때도 있지만, 마음을 잘 관찰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연상되는 사고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여 몸에 근육이 붙듯이 마음에도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시각적 자극을 통해 뇌에 시냅스가 형성되고 발전된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이름을붙이자면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보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 보는 것은 단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복잡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시각을 고차원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가 새로운 것을 보고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하며 거기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봄으로써 우리 마음은 거듭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