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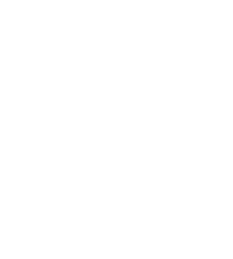
인류 역사는 줄곧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었다. ‘찾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물건을 얻으려고 뒤지거나 살핀다는 단순한 의미에서부터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추구한다는 형이상학적 의미까지를 아우른다.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등을 찾아내는 ‘발견’이나 현존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발명’도 있다. 미지의 땅을 찾으려고 하는 ‘탐험’의 영역도 있다.
글 구승준 번역가 · 칼럼니스트 / 사진 김경주
인류 역사는 줄곧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었다. ‘찾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물건을 얻으려고 뒤지거나 살핀다는 단순한 의미에서부터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추구한다는 형이상학적 의미까지를 아우른다.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등을 찾아내는 ‘발견’이나 현존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발명’도 있다. 미지의 땅을 찾으려고 하는 ‘탐험’의 영역도 있다.
글 구승준 번역가 · 칼럼니스트 / 사진 김경주
찾아야 왕이다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의 관리들은 날이면 날마다 ‘찾는’ 게 일이었다. 오늘날의 천문대처럼 별을 찾아내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던 관상감에 들어가려면 벌건 대낮에 외보성과 내필성을 찾아내야 했다. 이 두 별은 망원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고, 현대에 와서야 존재가 밝혀졌다고 한다. 북두칠성(北斗七星, 큰곰자리 일부)의 무곡(武曲, Mizar) 부근에 이 희미한 별들이 있는데 이미 고대 고구려시대의 천문도에도 그려져 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대부터 현대 이전까지 별을 찾아내고 관찰하는 일은 정권 유지에 반드시 필요했다.
왕은 직속기관을 통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농사절기나 일식, 월식을 예측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관상감에 소속된 장루서(掌漏署)는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담당했다. 왕은 하늘이 점지한 인물이며, 백성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을 전파했다. 이런 작업으로 인해 왕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하늘에서 점지한 인물이며 은혜를 베풀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합리화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천문학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천체물리학으로까지 발전했다. 육안으로 별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을 응용하여 천체의 물리적 성질이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100만 광년 떨어진 별이 있다고 할 때, 빛의 속도로 100만 년 동안 그 별에 가보고 나서야 찾아낼 수는 없으니 별의 밝기와 중력의 성질을 이용해 추론해내는 식이다.
아인슈타인도 물리학 방정식으로 일반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언했다. 물질을 빨아들이는 암흑과 같은 구멍이 있다는 이론은 얼핏 들어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훗날 스티븐 호킹에 의해 다시 입증됐고 발전되었다. 물질의 속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교감하며 관련 학문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그 와중에 핵폭탄이 탄생하기도 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발견
찾음’으로써 인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지 않다. 1997년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땅을 파던 중 유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발굴을 시작하자 볍씨 여러 개가 나왔다. 미국의 연대 측정기관인 지오크론과 서울대에서 연대 측정을 의뢰했더니 무려 1만 2890년~1만 4090년 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증거는 8000~9000년 전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됐다. 이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중국 학자는 ‘우인절적 국제대완소(愚人節的 國際大玩笑)’라며 조롱하였는데, ‘만우절에나 할 법한 국제적 장난’이라는 뜻이다. 한국 고고학계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국의 발굴조사단장은 볍씨를 미국으로 보내 연대검증을 다시 받았다. 마침내 2016년 국제고고학회에서 벼농사의 기원을 한국으로 규정했으며, 세계 고고학 교과서로 사용되는 『고고학개론서(Archelolgy:theories, meyhods and practice)』에도 최초의 벼농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1977년 경기도 연천 전곡리 한탄강 유역에서 그렉 보웬이라는 미군이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커피를 끓이기 위해 돌을 모았는데, 그중 몇 개가 범상치 않음을 발견하고 서울대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보냈다. 공교롭게도 이 미군은 입대하기 전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었다.
감정 결과 다섯 개의 돌은 30만 년 이전에 만들어진 애슐리언형 주먹도끼였다. 이전에는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하게 만든 주먹도끼가 주로 유럽에서 발견되었고, 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가 더 후진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기구석기 유물인 애슐리언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자 세계 고고학 교과서가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에서 애슐리언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자 일본 고고학계는 초조해졌다. 일본이 한반도에 기술을 전해주고 한반도 남부에 정권을 세워 지배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한반도보다 빠른 연대의 유물이 일본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마침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는 1981년 한반도보다 이른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렸다. 그러나 2000년 마이니치 신문 기자는 후지무라가 유물을 땅에 묻는 현장을 촬영하여, 일본의 구석기 유물이 조작된 것임을 확인했다.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은 삭제됐고, 관련 도서도 모두 환수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고고학계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
인간성에 대한 추구로 의학 장비 발전
불의 사용, 바퀴, 문자, 나침반, 종이, 인쇄술, 전기 등 수많은 발견 혹은 발명으로 인류는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의 편의나 고도의 지적 탐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생존이다. 인간이 살고 나서야 편의성이나 지적 탐구를 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학적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기, 물, 불, 흙에 대응하는 네 가지 체액이 모자라거나 넘쳐서 병이 발생한다고 믿어, 신에게 기도하거나 피를 뽑는 등의 치료를 하기도 했다. 이집트에서는 주로 동물의 배설물을 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기술은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할 정도로 발전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몸속에 카메라를 집어넣어 로봇의 팔로 수술을 하는 기구도 있다.
실제로 일산병원에서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빈치Xi로봇수술시스템’이다. 로봇의 카메라와 팔이 환자 몸속에서 움직이며, 집도의는 조종석에 앉아 확대된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며 수술한다. 사람의 손보다 훨씬 정밀하며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손이 닿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부위의 수술도 가능하며, 수술 후 출혈이 적고 흉터도 별로 남지 않는다.
방사선량과 조사 모양까지 조절해 정상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기 래피드아크(Rapidarc), 3차원으로 혈관을 조영촬영 할 수 있는 장비 등도 꿈에 그리던 것들이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1차원적인 의료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치료 이후 삶의 질까지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의료 철학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